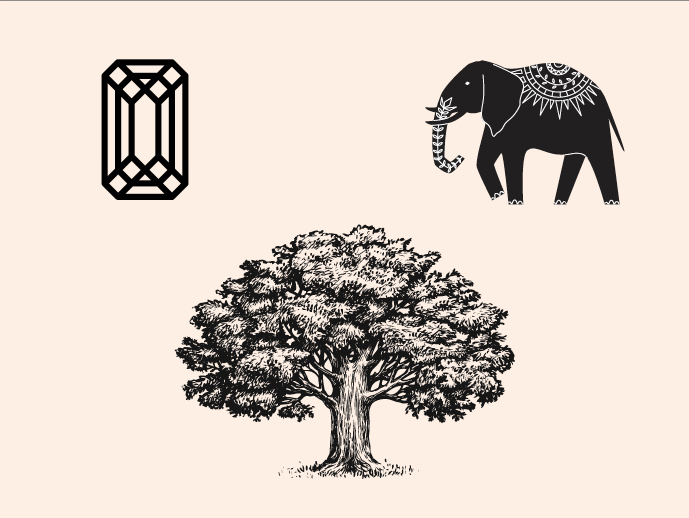2 서핑의 성지인 웰리가마(Weligama)의 툭툭은 지붕위에 서프보드를 싣고 달린다.
3 갈레(Galle)엔 콜로니얼 건축물 안에 들어선 세련된 카페와 상점이 많다.





2,3 시기리야(Sigiriya)인근에 자리한 하바라나(Habarana)마을.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스리랑카 농부의 밥상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 식당이 있다.
4,5 ‘리틀 잉글랜드’로 불리는 누와라엘리야(NuwaraEliya)의 풍경.


2 스리랑카의 기본식은 커리와 밥, 삼볼(Sambol)로 불리는 반찬과 로티(Rotti)같은 빵으로 구성된다.






거리에서 만난 스리랑카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선뜻 환한 웃음을 건넨다.
그들이 매일 만나는 이들에게 던지는 인사, “아유보완(안녕하세요)!”의 진짜 뜻은
축복의 말, “오래 사세요!”다.

“가기 전, 머문 내내, 돌아온 후에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아.” ‘스리랑카는 어떤 나라야?’라는 질문을 남에게도 듣고 스스로도 했지만 지금도 답을 못 찾은 것 같다. 아프리카에 갈 때도, 아마존 정글로 들어갈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스리랑카를 남의 말로 인용하는 대신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서 생각해낸 꼼 수는 전에 가본 다른 나라와 견주는 일이었다. 스리랑카의 마추픽추라는 시기리야, 19세기 영국의 소도시를 그대로 본뜬 누와라엘리야(Nuwara Eliya), 코끼리와 곰, 표범이 종종 출현하는 얄라국립공원(Yala National Park), 발리의 캉구보다 더 뜨거운 웰리가마를 종횡무진하는 여정 중 메모장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 “어제는 페루, 오늘은 영국, 내일은 아프리카, 모레는 발리로 간다.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이 작은 섬나라는 6대륙의 매력을 다 품고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지의 여행지’로 꽁꽁 숨어 있었을까?”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도 갖지 못한 채 낯선 상황에 툭 떨어져야 할 땐 사람을 만난다. 가이드북이며 에세이 같은 책 몇 권보다 거기 사는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 더 많은 걸 알려주기 때문이다. 서퍼와 승려, 농부, 티 소믈리에, 셰프, 가이드부터 대기업 여행사의 부사장까지 정말 많은 스리랑칸을 의욕적으로 만났다. 신할리어와 스리랑칸 잉글리시(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이었다)라는 언어 장벽을 뚫고 그들의 일상과 생각, 가치관이나 꿈 같은 것을 열심히 묻고 듣고 관찰했지만 역시나 ‘스리랑카 사람들은 000 하다’의 빈칸에 들어갈 공통의 키워드를 찾지 못했다. 코트라(KOTRA) 콜롬보 무역관의 보고서, 한국-스리랑카의 불교계를 이으며 동국대에서 강의도 하고 불교 신문에 칼럼도 종종 쓰는 담마끼띠 스님의 글, 그 밖에 각종 국문, 영문 기사에서 얻은 ‘여유롭고 선하며 낙천적이다’ ‘굉장히 잘 웃는다’ ‘유연하다’ ‘환대의 민족이다’ ‘욕심이 별로 없다, 게으르다는 뜻이다’ 같은 정보들을 쥐고 누군가를 만나면 예상이 항상 보기 좋게 빗나갔다. 어리숙한 관광객의 헐렁한 지갑을 노리는 데 혈안이라는 툭툭 기사나 여행 가이드는 경계심이 무색하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었고, 사회적인 지위 상승과 출세를 향한 야망이 높은 편이라는 도시의 젊은이들은 ‘내 배 한 척 갖는 게 꿈’인 마다가스카르 어촌 청년처럼 헐렁한 여유가 넘쳤다.
여정의 끝자락, 인도양이 한눈에 담기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잔잔한 파도에 시선을 던지며 해가 뜨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그간 메모장에 끄적였던 단어와 문장을 다 지웠다. 스리랑카를 어떤 말 안에 가두려고 할수록 진짜 스리랑카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내가 이 글을 읽는 이에게 쥐여줄 수 있는 건 단편일 뿐이다. 아침엔 야생 코끼리와 사슴, 물소를 보고 오후엔 서퍼와 트렌디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 나라. 3,000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1만 2천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며 일급 1,000 스리랑카 루피(한화 약 4천원)를 받는 차농부의 삶을 곱씹게 되는 곳. 그 엄청난 간극 사이에서 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두려움, 덧없고 유한한 인생 등의 뜬구름 잡는 생각을 매일 실컷 했다. 5세기 동안 지속된 식민사와 내전, 천재지변 등의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건너온 스리랑카 사람들은 바깥에서 씌우는 이미지에 흔들리지 않으며 분방하고 여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SEARCH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