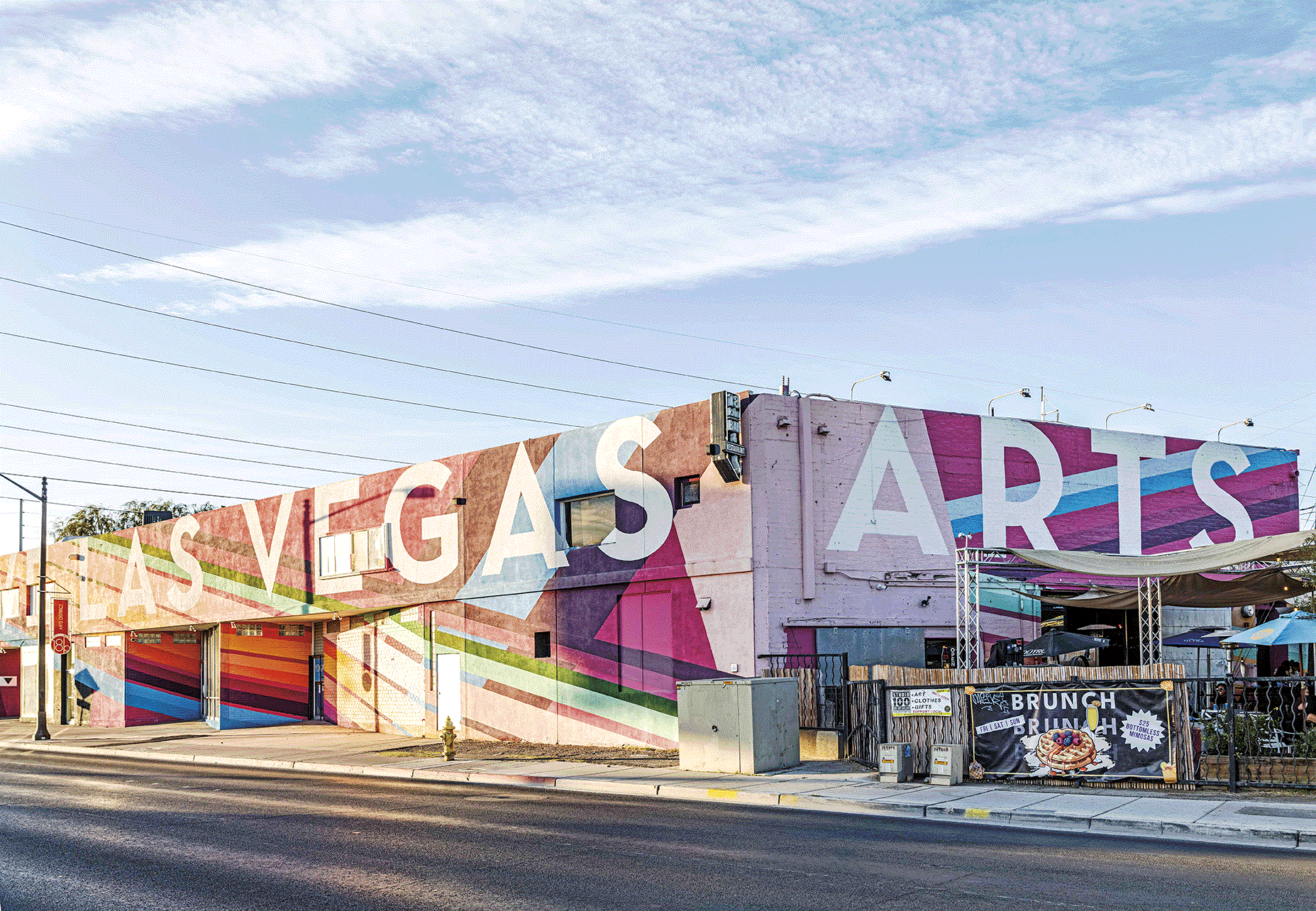DTLV
다운타운, 라스베이거스식 ‘쿨’을 만나는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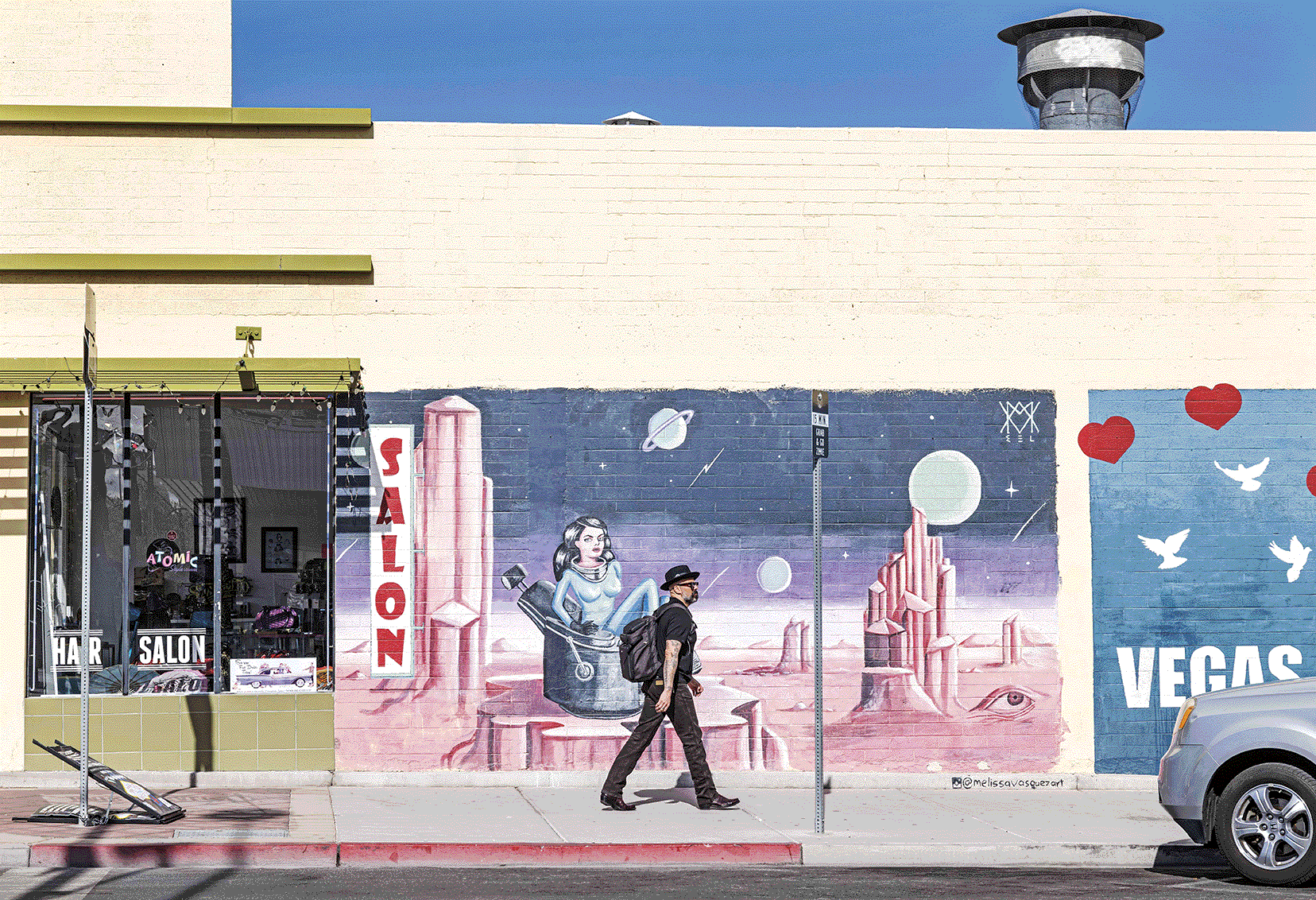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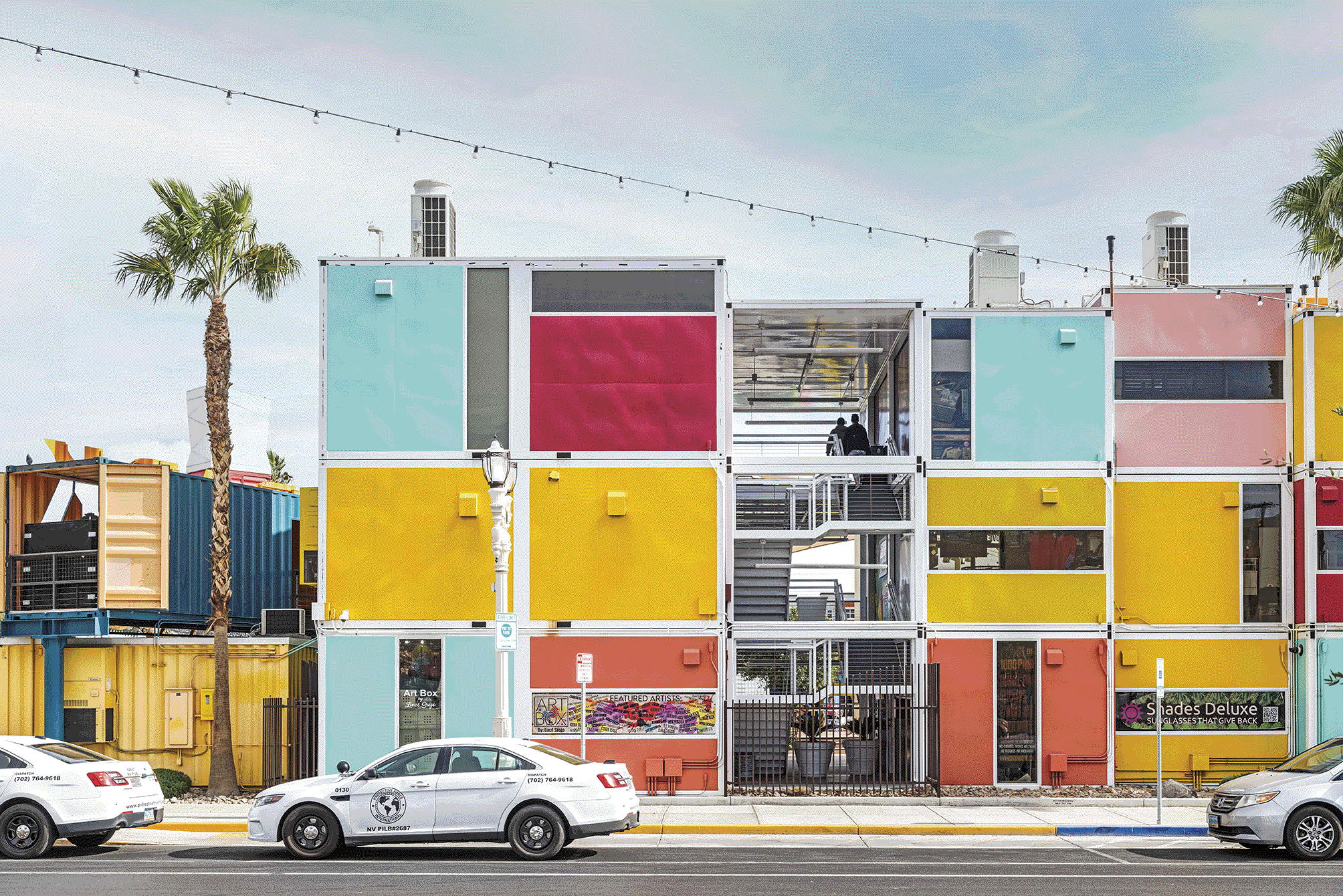
모두가 들뜨고 설레며 상기된 얼굴로 유흥을 즐기는 스트립에 오래 머물다 보면 슬슬 눈과 귀, 뇌가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눈치 없이 날뛰는 아드레날린 대신 평온과 고요로 이끄는 세로토닌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의 크리스틴과 점심을 먹다가 그럴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대부분 다운타운에서 시간을 보내요. 커뮤니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친절하고 정다운 분위기거든요. 낮에는 빈티지 숍에서 쇼핑을 하거나 갤러리에 방문하고, 해가 지면 바나 펍 호핑을 즐기곤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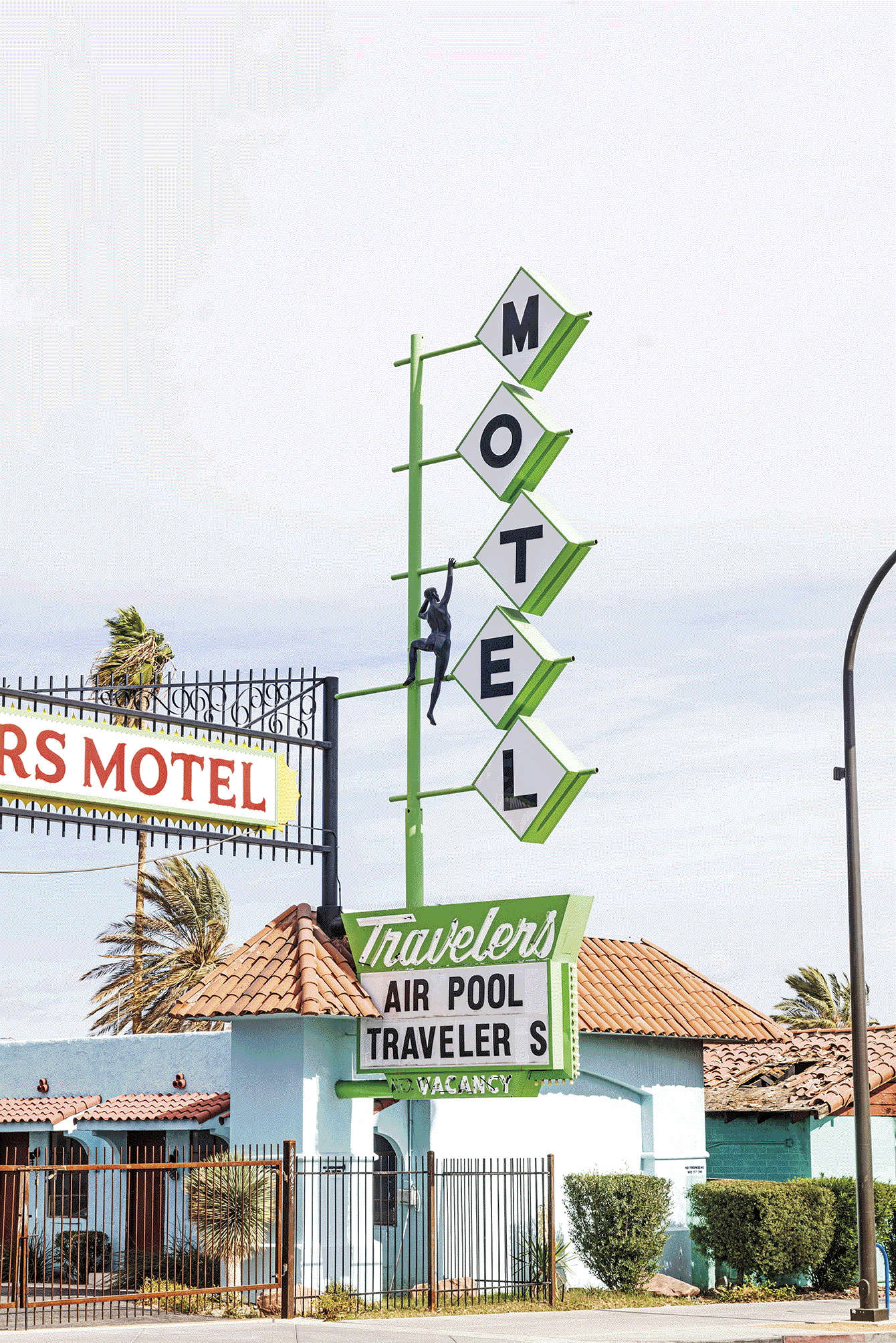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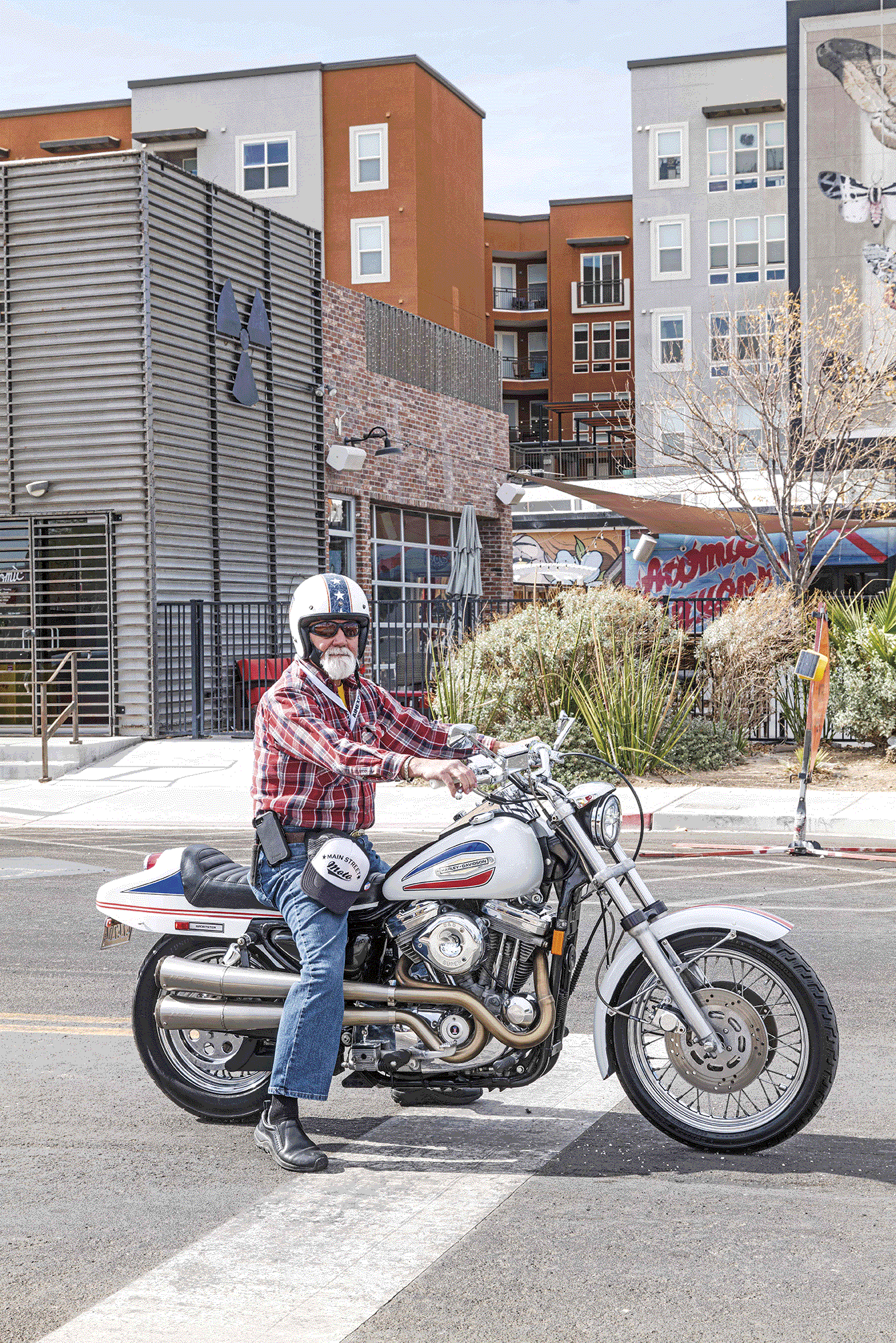
그에게 받아 든 ‘크리스틴의 최애 장소’ 목록을 들고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를 찾았다. 금요일 오전의 ‘메이커스 앤 파운더스(Makers&Founders, 이하 M&F)’엔 관광객으로 보이는 행색을 한 사람이 우리 말곤 한 팀도 없었다. 커피 머신과 원두 몇 봉지, 유리 진열장 안 알량한 샌드위치와 디저트 몇 가지 적당히 갖춘 카페인 줄 알았던 내가 M&F에서 마주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아침부터 불을 밝힌 네온사인, 진열장 가득한 칵테일 원료들, 바리스타보단 바텐더에 가까워 보이는 직원, 그리고 나초를 산더미처럼 쌓고 그 사이에 아보카도와 사워 크림, 잘게 찢은 바비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끼워 넣은 ‘가장 인기 많은 아침 메뉴’. 로컬들이 ‘꼭 가야 하는 맛집’으로 반드시 꼽는 M&F는 많은 사람들이 ‘세련됐다’고 여기는 브루클린이나 샌프란시스코식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러 밥과 커피, 단 음료와 디저트,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에 가깝다. 20% 이상의 팁을 받기 위해 꾸민 친절을 베푸는 스트립 레스토랑 (일부) 서버들과 다른, 다정하고 여유 넘치는 직원들을 보며 “라스베이건이 생각하는 ‘쿨(cool)’이란 이런 걸까?” 하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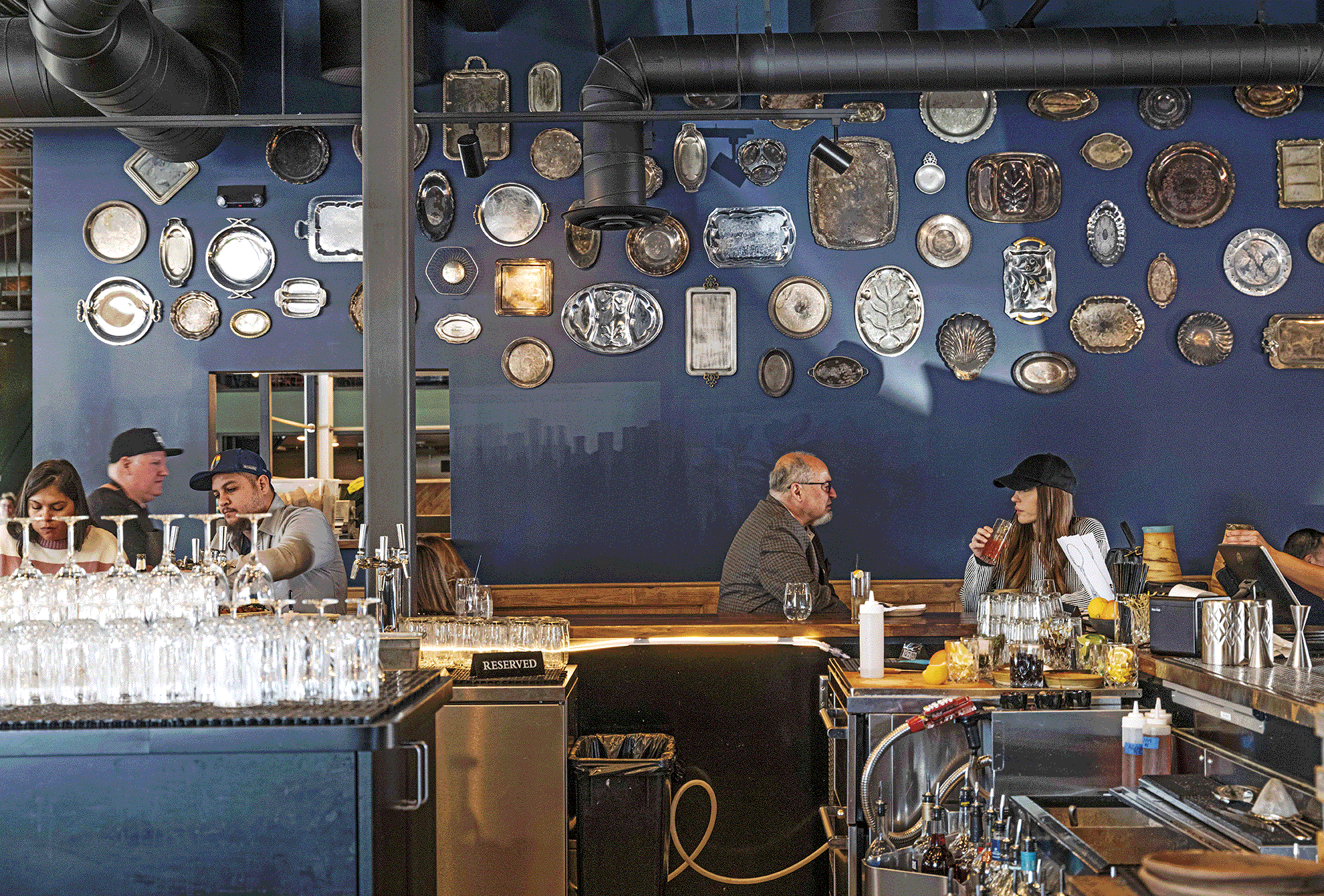

2 라스베이거스의 보물 창고, 더 레드 캣.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에스터스 키친’은 그 ‘쿨’의 최전선에 있는 식당이다. 누구보다 다운타운을 사랑하는 셰프 제임스 트리스의 이탤리언 레스토랑으로 최근 이사와 새 단장을 마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맛도, 가격도 호화로운 스트립 파인다이닝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이곳으로 향할 것. 나는 이곳에서 식전 빵으로 내온, 나흘 동안 발효한 반죽으로 구운(제임스가 내게 그 발효실을 보여줬다) 사워도우를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에 듬뿍 찍어 먹은 후 동행에게 이런 말을 했다. “중국산 김치 먹다가 마침내 우리 할머니가 담근 김장 김치로 호강하는 기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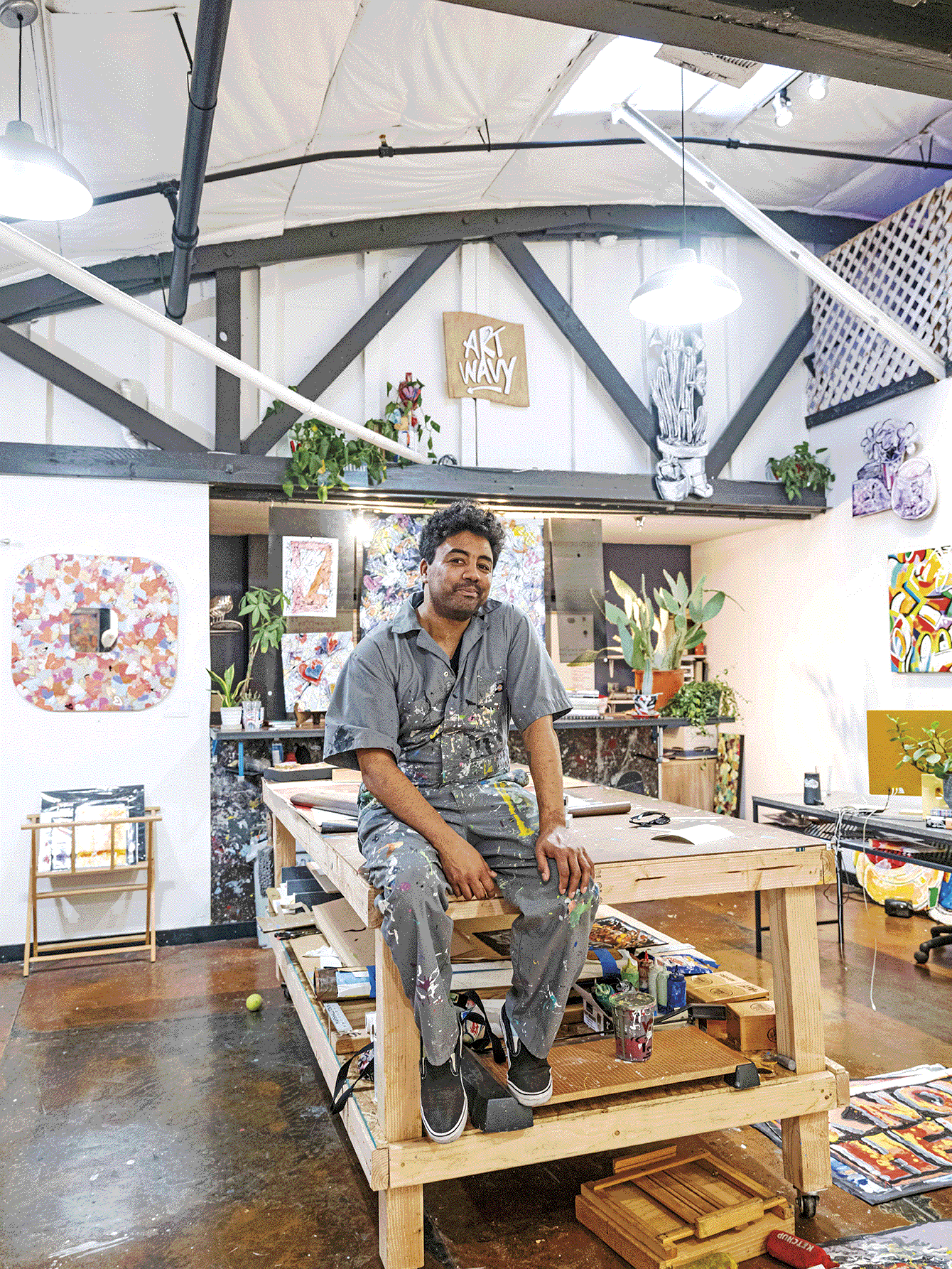
2 아츠 디스트릭트의 밤거리엔 바와 펍 호핑을 즐기는 로컬들이 가득하다.
배를 채운 후 산책에 나선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골동품점 구경과 갤러리 구경이다. 오래된 물건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싶은 이들은 65개의 점포가 한 매장 안에 들어선 ‘앤티크 앨리 몰(Antique Alley Mall)’이나 책, 레코드판 등 블랙 컬처와 관련된 다양한 컬렉션을 갖춘 ‘아날로그 도프(Analog Dope)’, 수천 벌의 빈티지 옷과 패션 액세서리, 소품이 가득한 ‘더 레드 캣(The Red Kat)’에 주머니 속 현금을 속절없이 빼앗길 것이다. 그 가게들을 다 둘러보고, 쓸모는 없지만 갖고 싶은 것 몇 개를 기어이 산 후 더 아츠 팩토리(The Arts Factory)로 향한다. 30개 이상의 갤러리와 스튜디오, 공연장과 서점, 카페가 모여 있는 이곳은 다운타운의 부흥을 가져온 행사 ‘퍼스트 프라이데이(First Friday)’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 블록 파티와 아트 워크가 함께 열리는 멋진 동네 잔치를 구경해볼 수 있을까, 살짝 기대했지만 내가 찾은 날은 아쉽게도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퍼스트 프라이데이는 매월 첫째 주에 열린다. 이제 크리스틴이 준 목록에 있는 마지막 장소로 향할 차례다. 이스트 프레몬트 거리(E. Fremont St.)에 자리한 ‘퍼블릭 어스(PublicUs)’는 커피에 한껏 집중하는 애호가를 위한 카페. 잘생긴 바리스타가 내려준 플랫화이트 한 잔과 계핏가루 가득 뿌린 애플파이도 물론 좋았지만 내 눈을 뺏은 건 창밖의 풍경이다. 웨스 앤더슨과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영화 세트장 같은 모텔들, 온갖 화려한 디자인의 네온사인, 결혼하러 가는 게 틀림없는 잘 차려입은 커플과 붉은 캐딜락을 타고 달리는 노인이 쉼 없이 나타나는 길. 다운타운은 그런 동네다. 머무는 내내 온갖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곳. 노트북을 꺼내 하루 종일 시놉시스 한 편 끄적이고 싶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본다.
Summerlin
고요, 여유, 자연이 있는 마을, 서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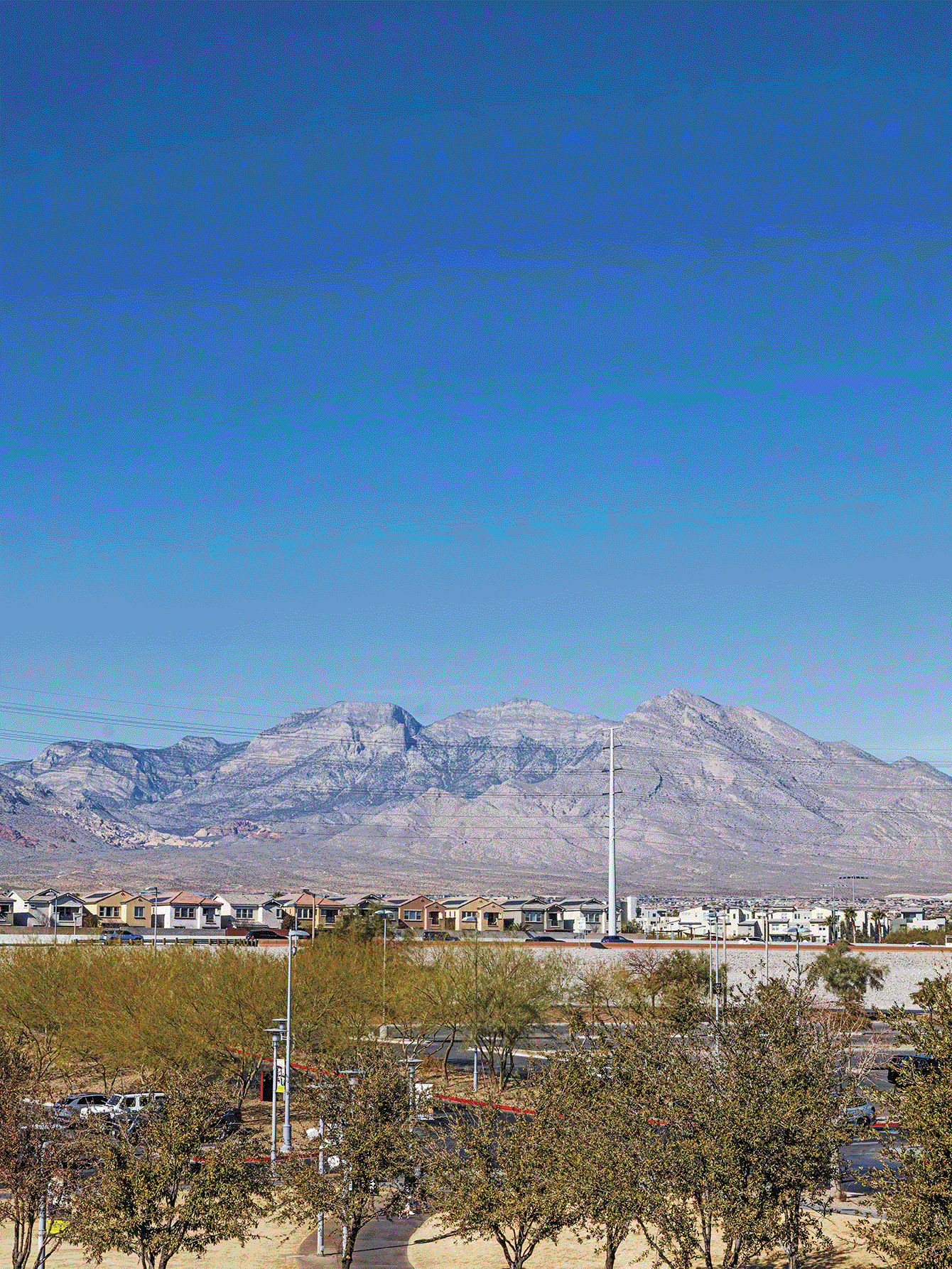
서머린에 가겠다고 했을 때 라스베이거스를 잘 아는 지인이 나를 뜯어말렸다. “레드록캐니언(Red Rock Canyon)에 오를 거 아니면 할 거 없을 텐데. 그냥 라스베이거스 부자들 사는 동네야.” 그 말을 듣고 서머린으로 출발하는 시간을 앞당겼다. 이 도시의 중산층은 뭘 누리고 사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오픈AI를 켠 후 ‘여행자가 서머린에서 할 만한 일’을 입력했다. 첫 번째로 알려준 ‘레드록캐니언 하이킹’은 시간이 부족해 건너뛰고 두 번째 목록을 차지한 ‘다운타운 서머린(Downtown Summerlin)’으로 향한다. 거대 부동산 그룹이 만든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의 시내는 건축 투시도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매끈했다. 라스베이거스 로컬이 아끼는 지역 로스터리 카페 ‘마더십 커피(Mothership Coffee)’엔 일요일 오전의 여유를 만끽하는 동네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창가에 앉아 개와 산책을 즐기는 사람, 룰루레몬을 제치고 미 서부 사람들의 새 유니폼이 된 알로(Alo)를 입고 요가 매트를 둘러멘 채 종종걸음으로 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행에게 속마음을 던졌다. “라스베이거스도 의외로 꽤 살 만한 도시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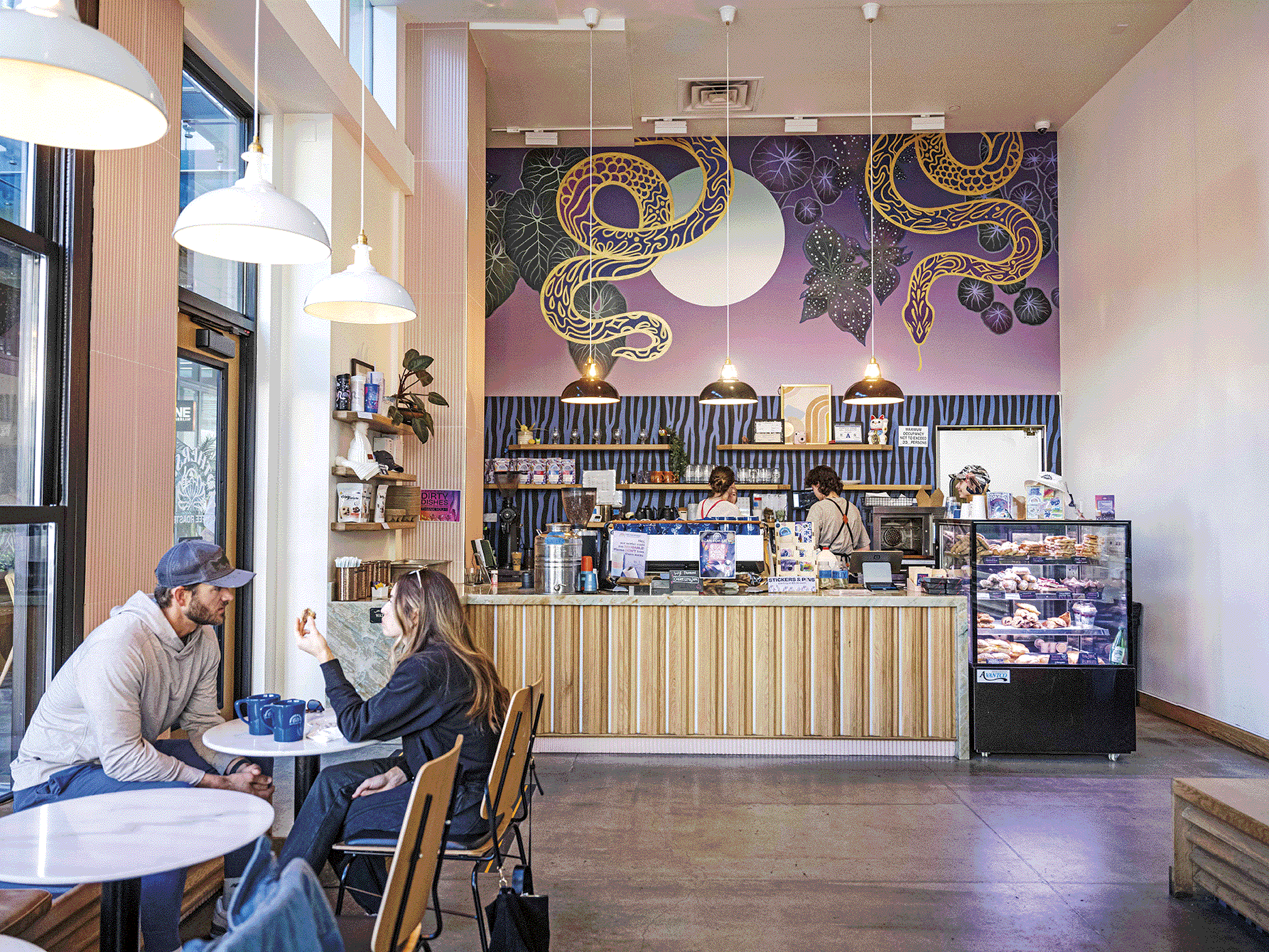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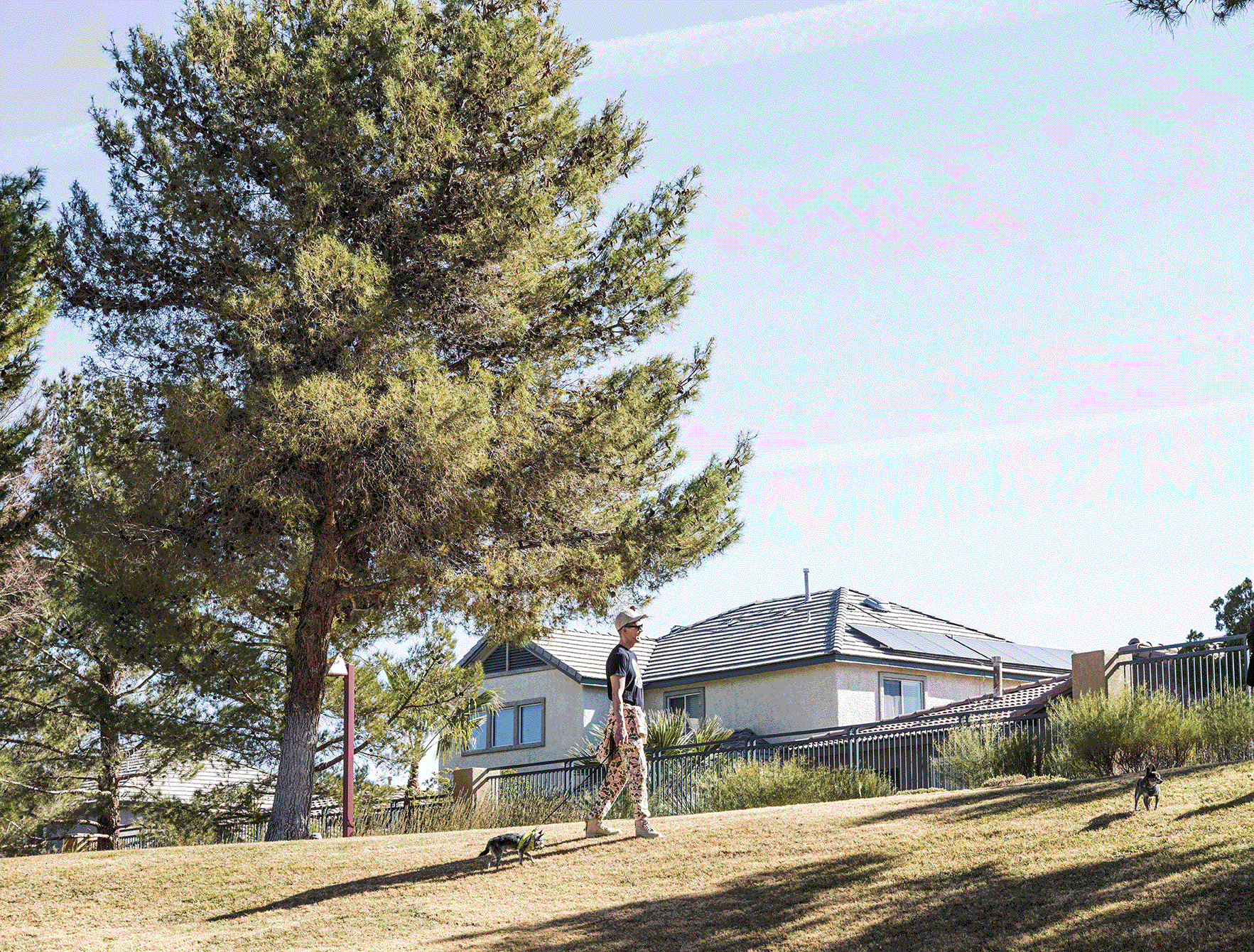
2 로컬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150여 개에 달하는 공원 중 한 곳을 찾을 것.
LA의 전통 부촌 벨에어(Bel Air)와 신흥 부촌 실버레이크(Silver Lake)를 섞은 것 같은 서머린은 라스베이거스의 타이틀을 신 시티(Sin City)에서 활기 넘치는 카지노 관광지로 바꾼 기업가, 하워드 휴즈가 사들인 땅 위에 세워진 계획 도시다. 주거·상업 지역과 공원, 학교, 골프 코스 등의 인프라가 정교하게 짜여 있어 로컬 사이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 손꼽힌다. 여행자, 혹은 다운타운에 사는 주민들도 종종 찾는 이유는 다운타운 서머린에서 10~15분만 나가면 닿는 레드록캐니언 때문이다. 레드록 리조트(Red Rock Resort), 램파트 카지노(Rampart Casino)를 품은 JW 메리어트(JW Marriott)가 스트립의 번잡함을 피해 카지노 게임, 쇼핑, 대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베이스캠프가 되어준다.
한나절의 짧은 리트리트를 즐기고 싶은 이들은 공원이나 호수로 향하면 된다. 서머린이 가진 150마일 이상의 산책로, 150여 곳의 공원 중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서머린 커뮤니티 파크로 향했다. 캐치볼을 즐기는 동네 개들, 라크로스·배구·필드 하키 같은 운동에 열중한 소년들을 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었나? 텀블러와 샌드위치가 든 봉투를 덜렁이며 소풍 즐길 자리를 찾는 주민들 틈에 천연덕스럽게 섞여 사막 도시의 따뜻한 겨울 해를 마음껏 쬐는 시간을 보냈다. 라스베이거스의 중산층이 값비싼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누리는 건 이런 하루다. 스트립엔 없는 고요와 여유, 그리고 어디를 봐도 눈을 꽉 채우는 웅장한 대자연 말이다.
Hoover Dam
네바다의 야생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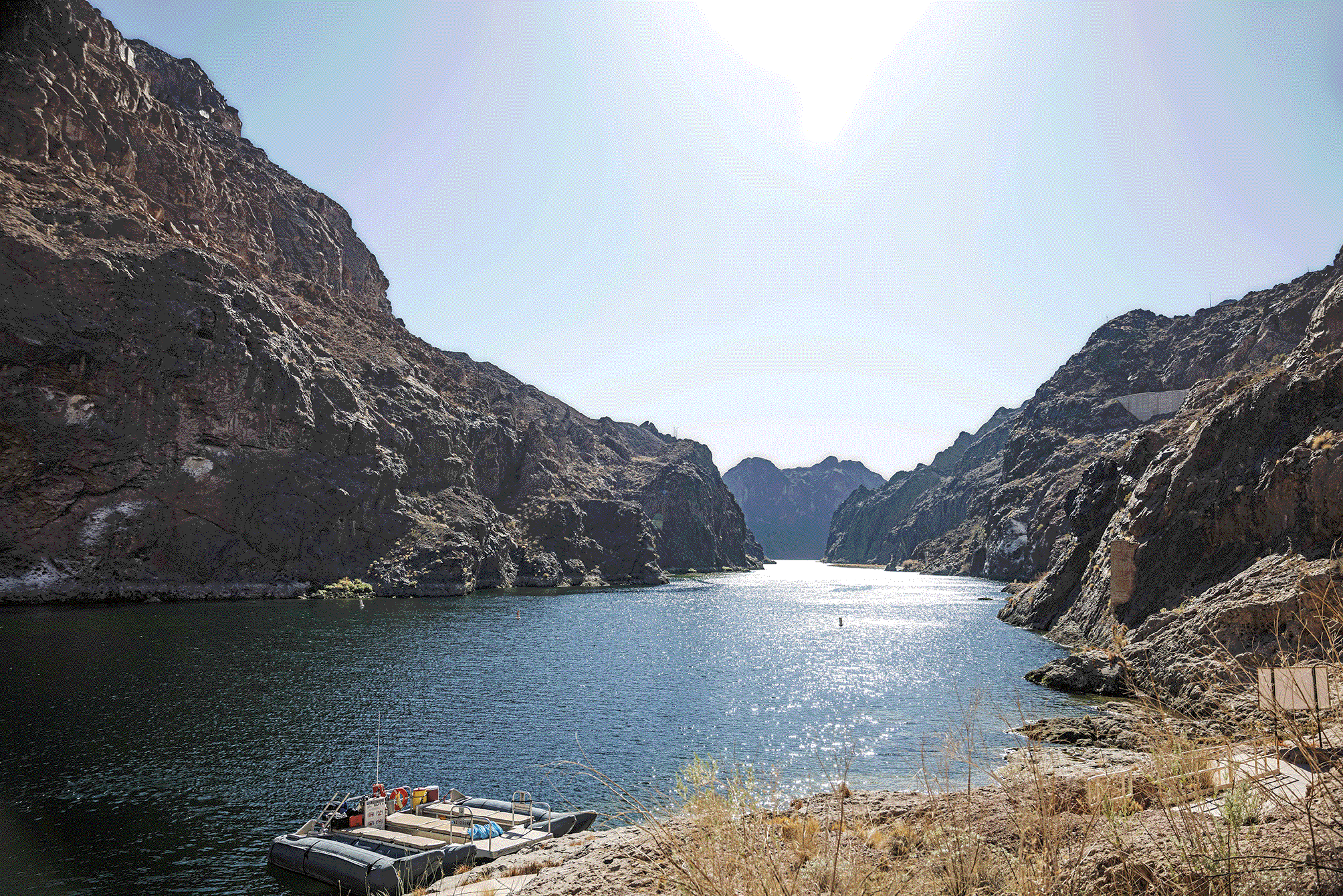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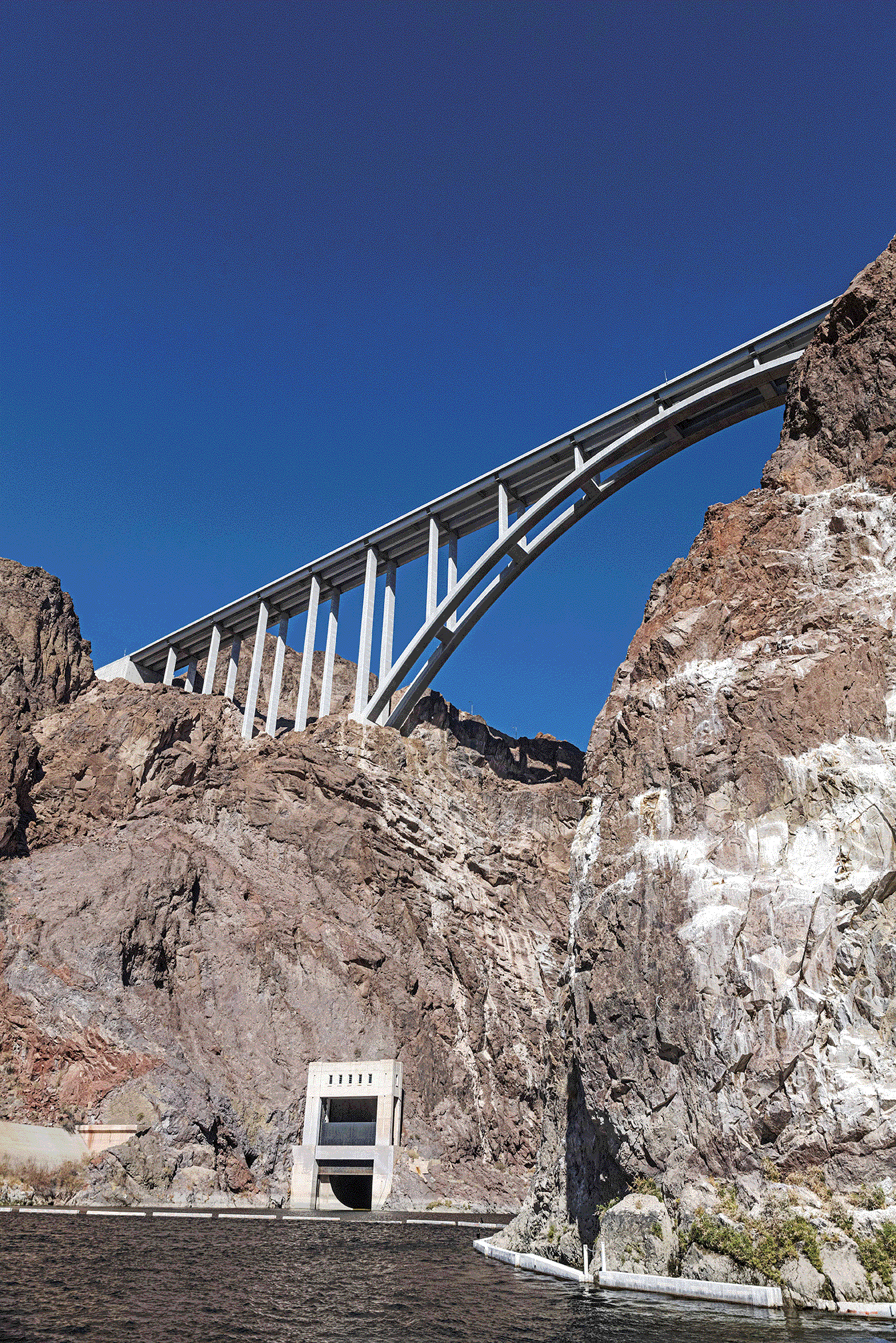
라스베이거스 가이드북에서 후버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남의 나라 댐을 뭐하러 구경해? 우리나라에 있는 소양강댐도 안 가는데.’ 물론 미국인들에겐 의미가 아주 큰 명소다. 후버댐의 안팎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는 미드 호수(Lake Mead)에서 유람선을 끄는 선장님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도화된 건축공학 기술이 적용된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물, 사막에 세워진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소, 대공황시대를 극복하게 해준 프로젝트, 거대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홍수를 조절하는 인프라. 후버댐의 대단한 스펙을 과시하는 온갖 수치들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따분한 얼굴로 넋을 놓고 있던 그때, 멀리 암흑 같은 절벽의 주름 사이로 정체 불명의 덩어리가 꿈틀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켠 후 렌즈를 바짝 당겨보니 놀랍게도 캠핑 체어 하나 덩그러니 펼쳐 놓고 은둔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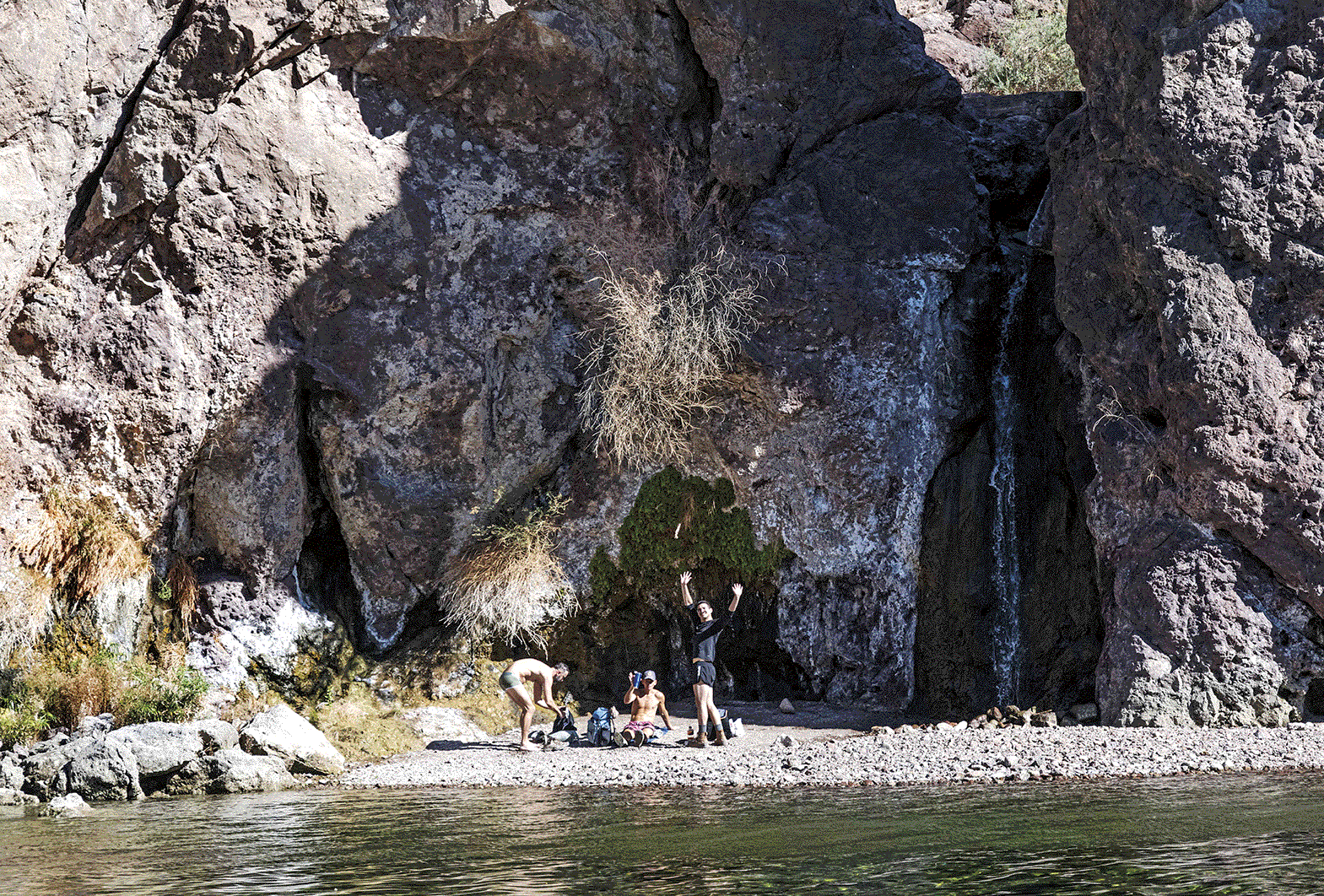
그 발견 이후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저 ‘댐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불과하다고 얕잡아본 곳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협곡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실시간 번역기 앱을 켜 선장님이 따발총처럼 내뱉는 얘기에 집중해본다. “미드 호수는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에 속한 면적 640km²의 세계 최대 인공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둘러싼 저 절벽은 블랙캐니언(Black Canyon)의 한 자락이고요. 약 17억 년이란 세월이 깎고 빚은 장대한 협곡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까는 안 보였던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절벽이 겹치는 비좁은 물길 위에서 낚시대를 드리운 노인, 돌무지에 작은 텐트를 치고 야생 속 캠핑을 즐기는 청년들, 반짝이는 물비늘 위 카약 안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소녀들. “이 물줄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 윌로 비치(Willow Beach)가 나타나요. 저기 보이는 카약들 대부분이 거기에서 출발하죠. 카약을 타면 강물이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에메랄드 케이브(Emerald Cave)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의 ‘멍 때리는 시간’을 위해 선장님이 설명을 멈췄다. 시속 20km로 달리는 고무 보트 위로 차가운 강물이 세차게 튀어올랐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후버댐을 등지고 선미에 자리를 잡았다. 인간과 인공이 없는 장면 앞에서 아주 잠깐,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서. 선글라스가 없다면 눈이 멀 것 같은 윤슬, 바위 위에서 날개를 말리는 가마우지, 엉덩이를 허공으로 추켜세우고 물속에 고개를 푹 박아가며 먹이를 쫓는 물닭의 한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껏 집중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11시에 배를 탔는데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다고? “아. 이 호수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네바다보다 한 시간 빠른 애리조나에 있어요. 이제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들 준비됐죠?”


 SEARCH
SEARCH